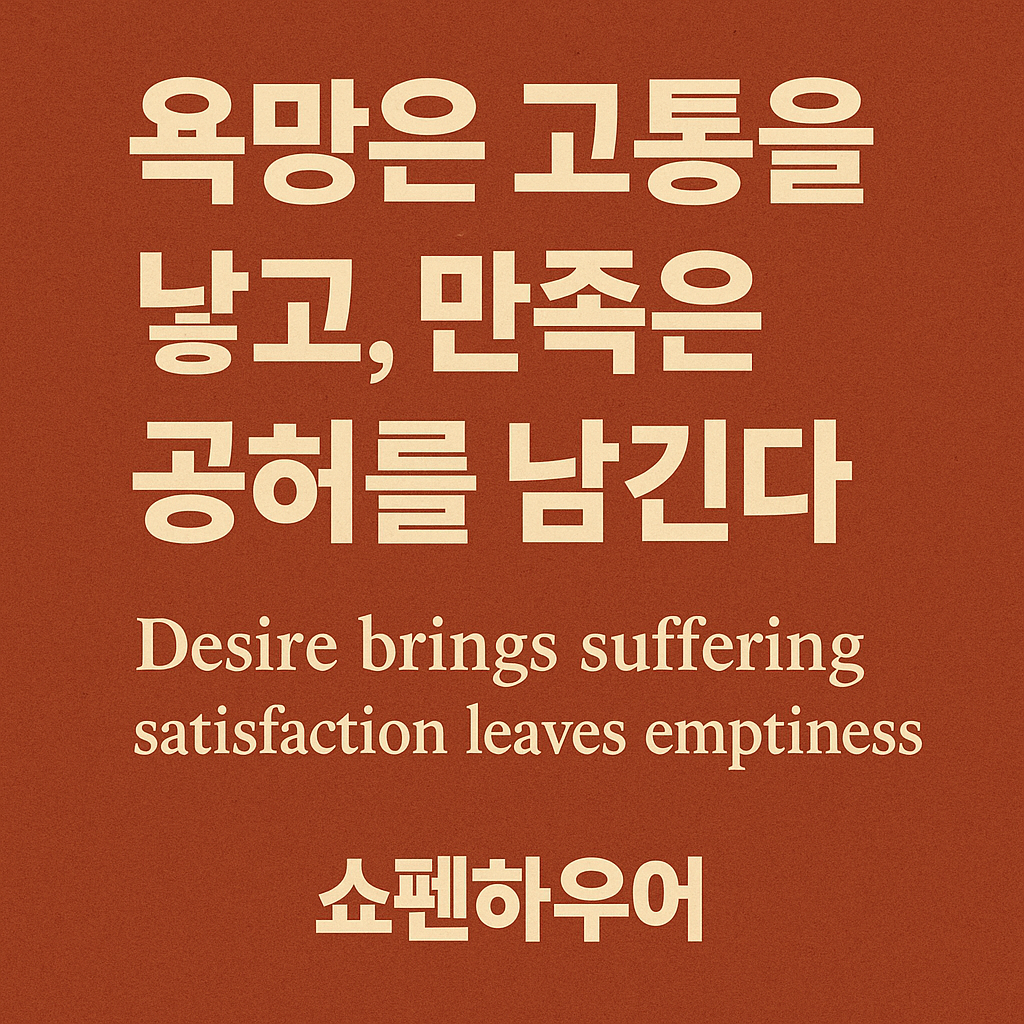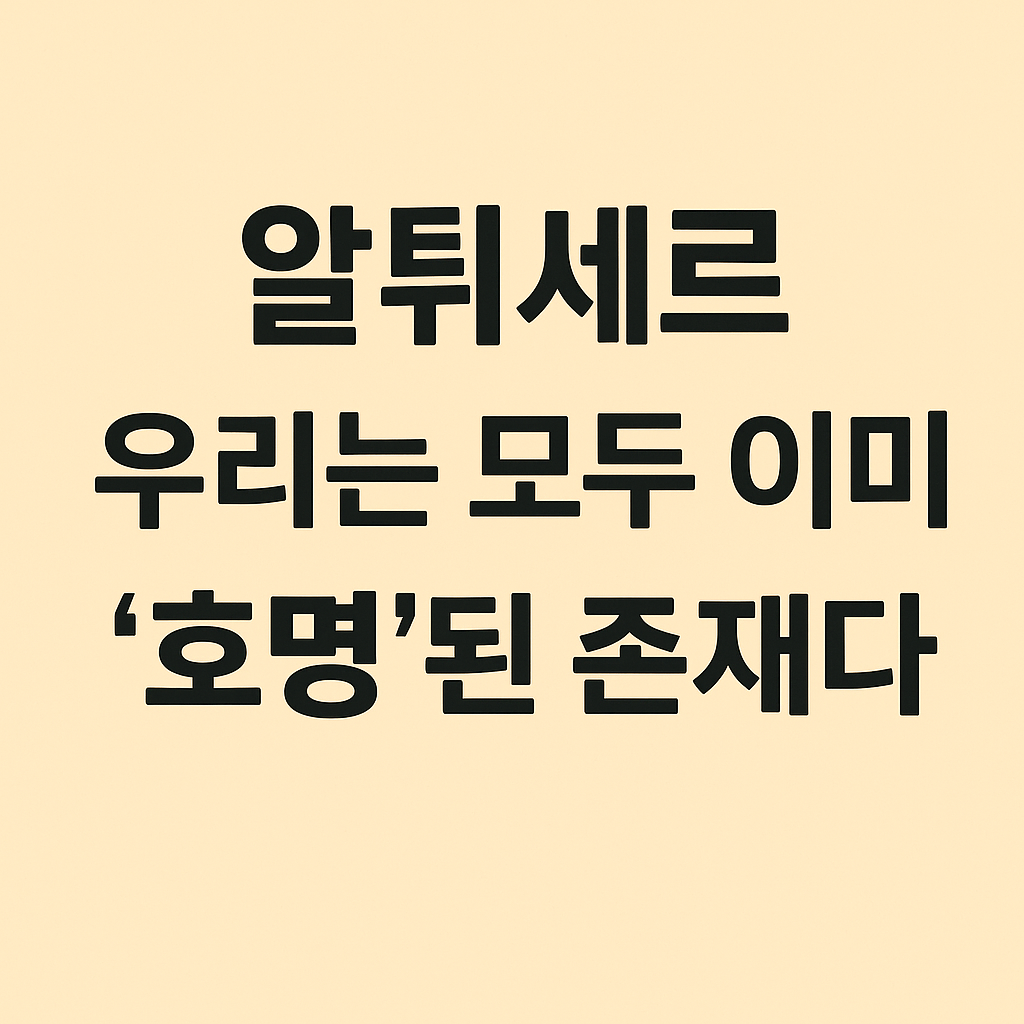Plotinus – Turn Inward, There Lies the Divine플로티누스(Plotinus, 204~270)는 고대 후기의 철학자이자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사에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가장 깊이 강조한 사상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말, “내면으로 향하라, 그곳에 신성이 있다”는 단순한 종교적 권유를 넘어, 인간이 외부 세계의 혼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고 본래의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끊임없는 자극과 번아웃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플로티누스의 말은 과거보다 오히려 지금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1. 내면의 신성, 외부가 아닌 내부로의 전환플로티누스가 말한..